
29일 한국대중음악상 선정위원회가 '제16회 한국대중음악상 시상식' 부문별 후보를 발표했다. 후보 선정 과정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글쓴이가 속해있는 분과(록, 모던록, 헤비메탈&하드코어)에 제출한 공식·비공식 추천 변들을 여기에 옮겨놓는다.
공식 추천변

블루스는 진지한 음악이 아니다. 블루스는 할 말 하고 즐길 거 즐길 줄 아는 자유의 음악, 농담의 음악이다. 느려도 그루브가 살아있고 나른한 연주에는 찰나의 번뜩임이 심줄처럼 박여있다. 최항석은 이 곡에서 행복하려면 뚱뚱해지라고 말한다. 심지어 뚱뚱해져야 부자가 된단다. 기타 톤과 연주에서 이미 고백하고 있는 ‘비비 킹 할아버지’까지 끌고 와 그는 ‘뚱뚱 예찬’으로 6분 13초간 너스레를 떤다. 언뜻 들으면 그냥 웃긴 곡 같지만 기타, 베이스, 키보드, 올겐, 드럼, 코러스가 빚어내는 짱짱한 일렉트릭 블루스 사운드는 이 곡을 마냥 웃고만 넘길 수 없게 만든다. 그것만큼은 ‘진지’하다. 진지한 감상, 자유로운 연주. 블루스는 이상한 음악이다.

이 작품엔 ‘자우림의 모든 걸 담은 앨범’이라는 말보다 ‘자우림이 잘하는 것들을 담은 앨범’이라는 말이 더 어울린다. 자우림은 전성기의 피카소가 그린 선 하나가 가진 의미, 비틀즈를 떠난 존 레논이 음 하나에 녹일 수 있었던 내공을 그대로 자신들 것으로 만들고 비틀어 펼쳐보였다. 데뷔 20주년의 셀프타이틀이 전할 법한 부담감은 차라리 마음 편하게 음악에 맞서버린 밴드의 차분함 앞에서 설 자릴 잃은 것이다. 이것이 자우림만의 해학, 자우림의 본질이다.
비공식 추천변
모던록 앨범 부문

자우림 [자우림]
밴드의 모든 걸 쓸어 담았다. 거의 버릴 곡이 없었고 덕분에 셀프 타이틀은 낭비되지 않았다. 21년의 공력, 10집이라는 역사. 부담스러웠을 법도 한 밴드의 음악적 자축은 다행히 타인들의 축하까지도 이끌어낼 수 있었다. 신나게 냉소하는 슬픔의 낭만. 딱 자우림의 음악이다.

포니 [태평양]
음악으로 새로운 공간을 체험케 하는 데서 포니의 [태평양]은 당당하다. 축축한 드론, 늘어진 기타와 베이스, 서걱대는 드럼 비트는 한편으론 아늑하고 한편으론 서늘하다. 살바도르 달리의 그림을 음악으로 표현했다면 이랬을까. 무채색 앰비언트의 게으른 중첩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본능적으로 꿈틀댄다.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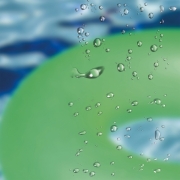
세이수미 [Where We Were Together]
세이수미는 이 앨범으로 완전한 자신들만의 호흡을 찾았다. 영리한 장르의 편집으로 서로 다른 시대를 엮어 같은 시대를 사는 현실의 록 팬들을 사로잡는다. 예쁜 멜로디와 편안한 리듬, 차분한 목소리가 한국을 넘어 세계를 설득했다. 90년대의 언니네이발관 1, 2집처럼 세이수미 1, 2집은 2010년대 대한민국 인디록의 가장 큰 수확으로 회자될 것이다.

허클베리핀 [오로라피플]
아프지만 아름다운 앨범이다. 록의 호전성을 묻고 드림팝의 순수성을 택하면서 허클베리 핀은 음악적으로 새로운 지평을 열어보였다. 이기용과 이소영의 오랜 호흡이 마치 이 앨범을 위해 그토록 질기게 이어져온 것인가 싶을 정도다. 한 가지를 오래 해온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자유, 표현할 수 있는 경지가 모두 담겼다. 명반이다.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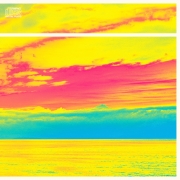
안녕바다 [701]
넬이 없어도 넬의 팬들이 넬을 만날 수 있는 순간. 안녕바다는 그 순간을 국내 인디록 팬들에게 선물한다. 위로는 슬픔의 빛을 머금어 아래로는 희망의 뿌리를 내리는 나무(보컬/기타)의 목소리만으로도 [701]은 짚고 넘어가야 하는 앨범이다. 감성의 깊이, 사유의 몸집이 발매한 앨범 수만큼 다부져졌다.
모던록 곡 부문

장기하와 얼굴들 ‘그건 니 생각이고’
아날로그 신시사이저와 6만 원짜리 스마트폰 앱으로 구축한 개구쟁이 그루브는 과연 장기하답다. 가사는 여전히 웃기고 신랄해 내 인생엔 아마추어, 남 인생엔 프로인 오지랖 진상들의 값싼 참견에 장기하는 "알았스 알았스"하며 “그건 니 생각이고”를 연거푸 날린다. 밴드 해체를 전제한 장기하와 얼굴들의 마지막 메시지가 “남이 뭐라건 네 갈 길 가라”는 게 재미있다.

완태 ‘차이의 사이’
이 곡을 듣고 있으면 절로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. 정말 ‘차이의 사이’에 관해 생각해보게 되는 것이다. 완만한 철학적 사고를 지향하는 완태의 가사는 지글거리는 얼터너티브 록 사운드와 크게 거리를 두지 않는다. 완태의 가사는 되레 그 음악에 손짓해 그 음악을 파고들어 그 안에서 자폭한다. 부드러우면서도 강렬한 한 방이 숨어 있는 곡. 넬이라는 운무가 구구돌스와 소울 어사일럼이라는 산들에 걸쳐있는 느낌이다.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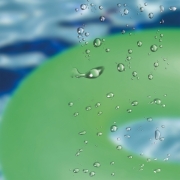
세이수미 ‘Old Town’
빗발치는 기타 리프와 동요하지 않는 보컬, 달콤한 그 소요에 빗장을 푼 베이스, 한 편에서 격렬히 리듬을 쌓는 드럼. ‘Old Town’은 서프록과 쟁글팝의 유산에서 한국 인디록의 가장 밝은 미래를 캐낸 세이수미의 대표곡으로 남을 것이다.

허클베리 핀 ‘Darpe’
느리고 자욱한 [오로라피플]의 숨통을 트기 위해 배치된 ‘Darpe’는 실제로 앨범의 숨통이 됐다. 허클베리 핀은 앨범 전체 분위기에서 살짝 동떨어진 이 곡의 친절한 멜로디와 비트로 듣는 이들이 완전한 고독에 매몰되지 않도록 배려했다. 물론 거기엔 킹스턴 루디스카의 브라스도 한 몫 했다.

김페리 ‘꿈’
AC/DC의 ‘You Shook Me All Night Long’이 나올 것 같은 인트로 기타. 하지만 곡은 이내 부드러운 보컬 멜로디와 슬픈 이별 사연을 싣고 얼트록의 드넓은 하늘로 날아오른다. 단순하지만 귀를 잡아끄는 매력이 이 곡엔 있다. 90년대와 2000년대 인디록이 그랬던 것처럼.
록 앨범 부문

에이치얼랏 [H a lot]
자신이 몸담고 있던 기존 밴드를 벗어나 새로운 팀 하나를 만드는 일은 당사자들로선 적잖은 위험을 감수해야하는 일이다. 일단 밴드가 잘 될 것이란 보장이 없고, 음악도 생각만큼 술술 나오리란 법이 없다. 그 위험을 감수하며 태어난 에이치얼랏은 다행히 안 하니만 못한 의기투합과 거리가 먼 나름의 ‘케미’로, 누가 들어도 납득할 만한 호쾌한 음악을 토해냈다. 능력보단 이해와 포용이라는 가치가 밴드 유지에 있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에이치얼랏 멤버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.

아시안체어샷 [IGNITE]
첫 곡 ‘뛰놀자’부터 휘몰아치는 록 사운드는 분명 신중현과 산울림, 갤럭시 익스프레스를 인용한 흔적이다. 아시안체어샷의 자기 증명은 우리 록의 자기 복제를 통해 거세게 감행된다. 얼큰하고 산발적인 블루스 록과 서스펜스를 머금은 우리네 국악·자연 정서를 봉합한 끝에 앨범 [Ignite]는 태어났다. 한국 록의 황홀한 현재다.

베인스 [Veins]
“뮤지션이 되고 싶고 록 스타가 되고 싶다”는 유희의 말은 비장하게 들렸다. 그 꿈의 전제는 당연히 ‘음악을 만들어 음악으로만 먹고 살 수 있는 생활’이다. 2인조로 재편된 베인스의 늦은 첫 정규작을 들으며 나는 유희의 꿈이 꿈으로만 머물지 않으리란 확신을 가지게 됐다. 빈티지 소울 보컬을 맞이한 그런지와 블루스 록의 변명. 베인스의 데뷔작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돼야 한다.

라이프앤타임 [Age]
무책임하고 싱거워보여 ‘웰메이드’란 말을 거의 쓰지 않는데 [Age]엔 어쩔 수 없이 그 말을 쓰고야 만다. 작곡도 연주도 믹싱도 마스터링도 모두 훌륭하다. 해외 밴드를 통하지 않고 ‘잠수교’ 같은 곡을 들을 수 있다는 건 어쨌거나 한국 음악 팬들에겐 축복이다. 작금 국내 인디록의 ‘정점’에 바로 라이프앤타임이 있다.

김간지x하헌진 [세상에 바라는 게 없네]
블루스를 쓰고 부르는 하헌진과 블루스를 지워내는 김간지의 드러밍. 찰진 둘의 합주에서 투박한 세련미가 배어나온다. 블루스에 대한 대중의 외면을 블루스를 향한 대중의 관심으로 돌릴 만한 단서랄까. 스튜디오 세 곳을 거친 소리 결과물도 꽤 괜찮다.
록 곡 부문

향니 ‘불안지옥’
따져야 할 서사도 지켜야 할 법칙도 없다. 향니의 음악은 제멋대로다. 마치 이성을 체포당한 인간의 욕망, 인간의 본능을 음악으로 듣는 기분이다. '싸이키델릭 뮤지컬'이라면 맞을까. ‘불안지옥’은 예측할 수 없는 향니의 상상력이 어디까지 뻗어갈 수 있는 지를 보여주는 음악적 가늠자다.

애리 ‘없어지는 길’
2018년에 김정미를 만난 느낌이다. 6분 38초간 듣는 이를 얼어붙게 만드는 이 단호한 싸이키델릭 향연은 ‘상상 그 이상을 들려주마’라는 애리의 천명처럼 들린다. 이 한 곡 때문에라도 그의 데뷔 EP는 주목받아야 한다.

에고펑션에러 ‘바보들의 왕’
작곡력보다 연주력에 더 주목해야 하는 밴드의 제대로 된 싸이키델릭 록 트랙. 낮게 이를 가는 김민정의 보컬, 견고하게 쌓아나가던 이승현과 곽노자의 리듬 벽을 허무는 김꾹꾹의 롱테이크 기타 솔로는 백미다. 자우림이 지미 헨드릭스를 만나면 이런 음악이리라.

호랑이아들들 ‘나의 기쁨’
영화 한 편을 불쏘시개로 지겹게 반복되고 있는 퀸 열풍. 호랑이아들들도 뜻하지 않게 이 이상한 '사회 현상'에 흔적을 남기게 됐다. 블루스 록으로 해석한 ‘Another One Bites The Dust’인 '나의 기쁨'으로 말이다.
헤비메탈&하드코어 부문

Loody Bensh [Mystic Ruin]
루디 벤쉬가 고등학교 때 쓴 곡들을 담았다. 그래서 듣는 이에 따라선 2% 모자람을 느낄 수도 있다. 하지만 역으로 그렇기 때문에 곡들은 열정적이고 순수하다. 다른 거 다 떠나서라도 메탈 팬이라면 기타 솔로와 톤 만큼은 들어봐야 한다. 내가 아는 한 이 나이, 이 경력에 이 정도 톤과 솔로를 뽑아내는 헤비메탈 기타리스트는 국내에 없었다.

피컨데이션 [Decomposition Of Existence]
묘기에 가까운 블래스트 비트, 구역질에 가까운 반지하 그로울링. 음악에서 국적 따지는 걸 별로 즐기진 않지만 한국에도 이런 밴드가 있다는 걸 알릴 필요는 있어보인다. 브루털 데스메탈을 즐기는 이들에겐 베트남에 빼앗긴 박항서 같은 밴드랄까.

Dark Mirror Ov Tragedy [The Lord Ov Shadows]
DMOT는 곡이 아닌 앨범에 귀 기울이게 만드는 밴드다. DMOT는 반드시 앨범으로 들어야 한다. 우주를 집어삼킨 듯 거대한 음의 침략, 유미주의에 안긴 섬세한 멜로디 꽃이 이번 작품에서 비로소 만개했다. 아마도 오스카 와일드가 블랙메탈을 했다면 이런 음악이었을 것이다.

노이지 [Triangle]
매스록에 가까운 리듬 브레이크, 젠트(djent)를 머금은 둔중한 기타 그루브가 메탈코어의 여문 속살을 질기게 후벼판다. 잔혹하고 후련한 보컬의 그로울링, 스크리밍도 최고다. 2018년 국내 헤비메탈을 논하면서 이 앨범을 뺀다는 건 2018년 상업 영화를 논하면서 [보헤미안 랩소디]를 빼는 것과 같다.
김성대 (한국대중음악상 록·모던록·헤비메탈&하드코어 선정위원)


